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 4월 산행 후기 - 아름다운 동행 ** 2013-06-10 06:58
아름다운 동행
한림반장 이영란
# 풍경 1
사월의 봄바람은 하늘이 변화하는 만큼이나 화려하다. 그 찬연한 봄날 한림원등반회에서는 '운길산'을
올랐다. 꽃잎들이 분분히 날으니 산들마다 축제를 여는 듯 반짝인다. 돌팍에 엎드린 고운 흙길을 밟고
걷는 느낌이 마치 땅 속에 숨은 생명들이 폴싹폴싹 올라오는 듯하고, 그 생명들이 우리들 발 끝으로
타고 올라와 몸 안 어딘가의 생명선과 만나 씨앗 하나 심어놓은 것같아 저 푸르디 푸른 나무들 부럽지
않게 쭉쭉 뻗어갈 것만 같다.
산이 불러서 모여 든 많은 등산객들의 모습 또한 가지각색이다. 그 마음 밭에 저들은 오늘 무엇을 심어
갈까. 좁다란 오르막이 시작되면서 우리 대원들은 한 줄로 나란히 산을 오른다. 가파른 오르막을 만나면
저만큼 앞서가던 대원 한 분이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며 가쁜 숨을 잠재우게 해주고, 마음들이 엮여져
서로서로 배려하는 모습에 봄바람마저 함께 장단을 맞춰준다. 사이사이 베낭을 열고 방울토마토며 오렌
지와 사과를 꺼내어 마른목을 적셔주는 손길에 따뜻한 정이 물씬 묻어난다.
하늘이 가까워질수록 오르막에 날숨이 터져나온다. 운길산은 호흡이 짧다. 그 때 진달래 물결이 양옆을
환히 등불인 양 비춰주는데 그 분홍 꽃잎 하나하나들이 모두 입을 쫑긋 벌리고 대합창제를 여는 듯하여
귀와 눈이 절로 반짝인다. 하늘거리는 가녀린 꽃잎 위에도 어김없이 바람 한 점 살풋 걸터앉아 하모니를
이룬다.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질 때 쯤 산나그네들의 모습이 정지되었다. 정상을 코앞에 두고 몸과
마음을 산바람에게 다 맡겨 버리고 땀방울을 씻어내는 그 옆을 우린 지나쳐 하늘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육백십 고지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은 온통 은세계다. 저 멀리 첩첩산능선들이 가지런하니 둘러앉아 머리에
푸른 산안개를 띠고는 신선처럼 노닐고 있다. 숨이 막힐 것같은 정경에 무릎이 저절로 꿇어진다. 내가 그리
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한 운길산 정상엔 당연히 걸려있을 것 같았는데
구름은 어디로 마실 가고 없고(원래 떠도는 게 구름인지라) 사람 사람들만이 가득하다. 다음 일정이 기다리
고 있어 발걸음을 돌리는데 내려오는 등 뒤로 박목월님의 <윤사월> 싯구절이 구슬처럼 꿰어져 따라온다.
- 송홧가루 날리는 / 외딴 봉우리 /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 산지기 외딴집 눈 먼 처녀사 / 문설주에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 -
# 풍경 2
정상을 정복한 자 어찌 곡주가 없으랴! 대장님이 부지런히 쉼터를 찾아나섰다. 아무도 없는 산모퉁이에
산은, 손님맞이 하듯 따사로운 햇살로 흙을 덮여놓고 작고 납작한 돌들이 동그맣게 모여있는 곳에 소박한
음식들을 차렸다. 김밥과 돼지껍데기, 갖가지 떡과 오렌지, 참외, 오이까지. 아! 피로회복의 알짜베기 막걸
리가 빠질 뻔 했네. 종이컵에 가득 차게 부은 막걸리로 한림원등반회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를 찐
하게 하고는 맛깔스런 대화를 안주삼아 두어 잔 마시고보니 술이 없다.
겨우 목젖만 적셨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 괜찮다. 다시 새 힘을 잔뜩 실은 몸에 리듬을 싣고는 수종사
로 향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를 앞에 놓고 긴 숨을 내쉰다. 저 강물 위에 먼 옛날 언젠
가는 배 띄워놓고 시를 읊고 노랫가락을 읊조렸을 텐데 저 강물은 알고 있을까. 수종사에 오면 그윽한
녹차 한 잔 하려했지만 등산객들이 워낙 많아 고즈늑한 분위기를 낼 수가 없어 그만둔다. 강물을 배경으로
단체사진만 찰칵.
대원들의 이마를 방울방울 적시던 땀방울이 다 식을 즈음 흙길이 아닌 시멘트길을 타박타박 걸으며 내려
온다. 가끔씩 수종사로 올라가는 차들과 만나니 산길이 오히려 그립다. 그러데 앗! 대원 한 분이 안 보인
다. 분명 단체사진도 함께 찍었는데. 내 핸드폰은 베터리가 없어 이미 불통인데 큰일이다. 어찌할 수 없
어 그 자리에 멈춰선다. 얼마 후 앞 대원들한테 연락이 닿았다. 먼저 저 산 아래 내려와 기다리고 있다고.
내림길은 속도가 훨씬 빨라 금새 내려왔다.
애닯게 한 그 대원은 인공연못과 푸른 들판을 배경으로 야외 테이블에 앉아 함박웃음을 머금고 있다. 어
차피 이 자리에 우리의 발목이 묶일 것 같아 하산주 잔치를 벌였다. 도토리묵과 돌미나리골뱅이무침, 그
리고 녹두빈대떡이 한데 어우러지니 곡주가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시원한 바람은 쉴 새 없이 우리
주변을 넘나들고 산내음에 취해보려는 즈음 '가곡'이 한 대원 입에서 터져나온다. 문제의 그 대원이다.
와우~ 푸른들과 작은연못의 작은조각배도 지나가는 등산객들도 우리는 다 잊었다. 이 순간부터.
우린 봄바람이 났다. 줄줄이 가곡이 불려지고 동문선배님의 한시 낭송과 낱낱의 뜻풀이와 낭낭하면서도
장엄한 성독에 우리는 탄성이 절로나와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임옥균교수님의 "당신의 마음(방주연)"에
고무된 이성호대장님의 "그네"는 우리를 전율케 만들었다. 2절만 부르신 것이다. 가사가 아주 마음에
드신다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서서 열창을 하셨다. 이 봄날 아니면 언제 부르랴 해서 답가로
"봄날은 간다"가 이어지고 손끝에서 손끝으로 말없는 말이 전달되는 사이 시간은 나긋나긋 흘러흘러
옆구리를 간지럽힌다.
산이 부르지 않아도 우린 또 다시 베낭을 메고 산을 오를 것이다. 이 '아름다운 동행'에 한림원 여러분
들이 날로날로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어디 먼 데서 귀대이고 엿듣고 있지 말고 함께 동행하여
산을 오르고 싶다. 함께 해 주신 이성호등반회대장님, 임옥균교수님, 동문선배님, 한림계제 동문 후배
님들, 그리고 학정계제 후배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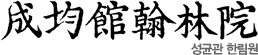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